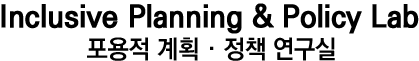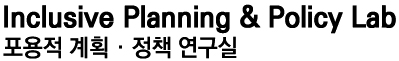OPEN BOARD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한 한국의 여정
교수님 글
작성자
In Kwon Park
작성일
2024-06-15 10:50
조회
1467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한 한국의 여정
유엔 해비타트가 3차 회의를 열고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한 지도 8년이 다 되어간다.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서는 ‘더 좋고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시의 비전과 실행 계획을 담은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고,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이제야 처음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하니 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기대한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는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 제시된 미래 도시의 비전이다. 이 비전은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공정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저렴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생산하고 이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정의는 바람직한 미래 도시의 ‘실체적’ 요소로서 ‘공정’, ‘안전’, ‘건강’, ‘접근성’, ‘저렴성’, ‘회복력’, ‘지속가능성’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도시를 생산하는 데 참여하고 그 결과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도 포함된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 의제의 이행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두 요소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한 한국의 여정은 사실 2016년 해비타트 III 회의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1960~70년대 개발 시대에 이미 종교계와 지역사회 조직 운동을 중심으로 도시 빈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공동체 자조를 지원하는 운동이 있었다. 이런 활동은 빈곤층이 도시 생활에서 배제되지 않고 도시의 기회와 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1980년대의 도시 주거권 운동 역시 이전의 도시빈민운동 연장선에 있었다. 1985년 목동 철거민 투쟁 이후 철거민 운동은 정부 및 지자체와 심하게 대립하기도 했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도시 주민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그 결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나타난 공해추방운동은 우리나라에서 환경 의식을 대중화한 최초의 시도였다. 이를 계기로 1990년대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졌다.
당시 국가도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사회운동 세력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지는 못했다. 1960년대 국가는 무허가 불량촌을 일종의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일부는 현지 개량하고 나머지는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및 사회운동 세력과 크게 충돌했음은 당연하다. 1960년대 말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불량주거지 제거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시민아파트를 건설했고, 1980년대 말에는 철거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도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는 주민과 사회운동 세력을 정당한 정책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배제하고 때로는 탄압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는 사회운동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국가는 시혜 차원에서 일부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도였다.
절차적 측면에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주민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일이다. 소통과 참여에 관한 담론과 제도가 확대되었고, 특히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주민조직 및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도시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2010년대 이후로는 시민사회와 주민이 도시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고, 지자체와 정부는 이들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앞장서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경제를 이끌며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시민운동으로 시작되어 여러 지자체의 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하향식으로 이뤄지던 도시 재개발에도 점진적 개발과 상향식 계획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도입되어, 도시계획 및 정책의 절차적 포용성이 다시 한번 크게 확대되었다. 그전까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여성, 장애인, 외국인 이주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처지에서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공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의 선도적인 문제 제기와 자조 활동,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낮은 빈곤율과 실업률, 높은 주택 보급률과 서비스 접근성, 안전한 식수, 폐기물 처리, 편리한 대중교통 등 지표들은 우리의 발전상을 잘 보여준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다양한 도전과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인 빈곤, 사회적 약자의 실업 문제, 소원한 사회적 관계와 외로움, 부족한 공공공간 등이 그것이다. 아파트 단지 위주의 주거 양식과 폐쇄형 주거단지(gated communities)로 인한 도시 공간의 구획화 경향 또한 문제다. 이런 문제들은 때로 양적 지표로는 잘 포착되지 않지만, 도시 공간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소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 도시 발전의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역사는 개발 시대에도 주민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도시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점은 우리의 전철을 밟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현재의 복잡한 우리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중요하다. 유엔 해비타트에서도 계속 강조하듯이,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주민조직, 학계,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주체들의 노력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함께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은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국토 2024년 5월호(Vol.511) pp. 2-4
https://library.krihs.re.kr/library/ext/viewer?fileUrl=https://krihs.cdn.gov-ntruss.com/old/IMG/000/047/5203/311d1d2e-dc15-417b-961f-0f3f636178e3.pdf?token=st=1718415488~exp=1718415492~acl=/old/IMG/000/047/5203*~hmac=b7f40233f8ce9780da2e36c862213b24f3066b7b923da543a02733b69d7a1a64
유엔 해비타트가 3차 회의를 열고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한 지도 8년이 다 되어간다.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서는 ‘더 좋고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시의 비전과 실행 계획을 담은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고,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이제야 처음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하니 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기대한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는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 제시된 미래 도시의 비전이다. 이 비전은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공정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저렴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생산하고 이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정의는 바람직한 미래 도시의 ‘실체적’ 요소로서 ‘공정’, ‘안전’, ‘건강’, ‘접근성’, ‘저렴성’, ‘회복력’, ‘지속가능성’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도시를 생산하는 데 참여하고 그 결과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도 포함된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 의제의 이행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두 요소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한 한국의 여정은 사실 2016년 해비타트 III 회의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1960~70년대 개발 시대에 이미 종교계와 지역사회 조직 운동을 중심으로 도시 빈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공동체 자조를 지원하는 운동이 있었다. 이런 활동은 빈곤층이 도시 생활에서 배제되지 않고 도시의 기회와 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1980년대의 도시 주거권 운동 역시 이전의 도시빈민운동 연장선에 있었다. 1985년 목동 철거민 투쟁 이후 철거민 운동은 정부 및 지자체와 심하게 대립하기도 했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도시 주민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그 결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나타난 공해추방운동은 우리나라에서 환경 의식을 대중화한 최초의 시도였다. 이를 계기로 1990년대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졌다.
당시 국가도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사회운동 세력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지는 못했다. 1960년대 국가는 무허가 불량촌을 일종의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일부는 현지 개량하고 나머지는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및 사회운동 세력과 크게 충돌했음은 당연하다. 1960년대 말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불량주거지 제거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시민아파트를 건설했고, 1980년대 말에는 철거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도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는 주민과 사회운동 세력을 정당한 정책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배제하고 때로는 탄압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는 사회운동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국가는 시혜 차원에서 일부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도였다.
절차적 측면에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주민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일이다. 소통과 참여에 관한 담론과 제도가 확대되었고, 특히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주민조직 및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도시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2010년대 이후로는 시민사회와 주민이 도시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고, 지자체와 정부는 이들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앞장서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경제를 이끌며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시민운동으로 시작되어 여러 지자체의 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하향식으로 이뤄지던 도시 재개발에도 점진적 개발과 상향식 계획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도입되어, 도시계획 및 정책의 절차적 포용성이 다시 한번 크게 확대되었다. 그전까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여성, 장애인, 외국인 이주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처지에서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공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의 선도적인 문제 제기와 자조 활동,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낮은 빈곤율과 실업률, 높은 주택 보급률과 서비스 접근성, 안전한 식수, 폐기물 처리, 편리한 대중교통 등 지표들은 우리의 발전상을 잘 보여준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다양한 도전과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인 빈곤, 사회적 약자의 실업 문제, 소원한 사회적 관계와 외로움, 부족한 공공공간 등이 그것이다. 아파트 단지 위주의 주거 양식과 폐쇄형 주거단지(gated communities)로 인한 도시 공간의 구획화 경향 또한 문제다. 이런 문제들은 때로 양적 지표로는 잘 포착되지 않지만, 도시 공간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소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 도시 발전의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역사는 개발 시대에도 주민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도시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점은 우리의 전철을 밟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현재의 복잡한 우리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중요하다. 유엔 해비타트에서도 계속 강조하듯이,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주민조직, 학계,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주체들의 노력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함께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은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국토 2024년 5월호(Vol.511) pp. 2-4
https://library.krihs.re.kr/library/ext/viewer?fileUrl=https://krihs.cdn.gov-ntruss.com/old/IMG/000/047/5203/311d1d2e-dc15-417b-961f-0f3f636178e3.pdf?token=st=1718415488~exp=1718415492~acl=/old/IMG/000/047/5203*~hmac=b7f40233f8ce9780da2e36c862213b24f3066b7b923da543a02733b69d7a1a64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